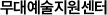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국립극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 공연
- 교육
- 이용안내
- 소식 · 참여
- 극장소개
-
빠른예매
- 추천공연
-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국립극장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화합>
- 세계무용연맹한국본부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 더 베스트 컨템포러리 댄스 컬렉션
- 관현악시리즈Ⅰ <어쿠스틱>
- 세계무용연맹한국본부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 탄츠올림프 아시아 갈라
- 국립극단 청소년극 <위험한 놀이터>
- 국립창극단 <심청>
- 국립극장 기획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 2025 세계음악극축제 : 국내초청작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 관현악시리즈Ⅱ <2025 작곡가 프로젝트>
- 2025 세계음악극축제 : 해외초청작 <죽림애전기>
- 2025 세계음악극축제 : 국내초청작 <정수정전>
- 2025 세계음악극축제 : 한일합동 <망한가>
- 국립무용단 <사자(死者)의 서(書)>
- 2025 세계음악극축제 : 해외초청작 <노가쿠: 노와 교겐>
- 창극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 홍콩발레단 <로미오 + 줄리엣>
- 2025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9월
- 국립창극단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 2025 <정오의 음악회> 10월
- 전유오 춤·소리·어울림 <토지>
- 극단 툇마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사)케이글로벌발레원 <인어공주>
- 2025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10월
- [2025 SPAF] <룸 위드 어 뷰>
- 국립국악관현악단 <국악가요>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 장선희발레단 <호두까기인형 in Seoul>
-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 국립무용단 <2025 안무가 프로젝트>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더 벨트>
- 국립현대무용단 <더블 빌: 김성용 & 윌리엄 포사이스>
- 국립합창단 <한국 가곡의 모든 것>
- 2025 <정오의 음악회> 11월
- 2025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11월
- 국립창극단 <이날치傳>
-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 2025 <정오의 음악회> 12월
- 국립극장 기획 <공생, 원>
-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Ⅰ : 배정혜, 국수호〉
- 2025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Ⅱ : 김현자, 조흥동〉
- <2025 윈터 콘서트>
- 2025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靑風國樂)>
- (주)나인스토리 <더 드레서>
- 2025 국립창극단 <송년음악회 - 어질더질>
- <2026 신년 음악회>
- (주)에이콤 <몽유도원>
- 국립창극단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가제)
- 국립무용단 <2026 축제>
- 2026 <정오의 음악회> 3월
- 202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3월
- 국립창극단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 관현악시리즈III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
- 2026 <정오의 음악회> 4월
- 국립극장기획 <2026 함께, 봄>
- 202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4월
-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 국립무용단 <귀향(歸鄕>
- 국립창극단 <절창Ⅵ>
- 2026 <정오의 음악회> 5월
- 202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5월
-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 라이브(주)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 국립극단 <조광화의 신작>(가제)
- 국립극장 기획 <좋으실 대로>(가제)
- 관현악시리즈IV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 202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6월
-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 국립무용단 <탈바꿈>
- 국립창극단 <효명>
- 인문학 콘서트 <공존(Survive)>
- [패키지] 25-26 프리패키지 S -Ⅰ
- [패키지] 25-26 프리패키지 R -Ⅰ
- [패키지] 25-26 NOK 시리즈 패키지
- [패키지] 25-26 KIMF 세계음악극축제 올패스 패키지
- [패키지] 25-26 NTOK 가무악 패키지
- [패키지] 25-26 완창판소리 Ⅰ
- [패키지] 25-26 정오의 음악회 I
- [패키지] 25-26 댄스, 댄스, 댄스 패키지 R
- [패키지] 25-26 댄스, 댄스, 댄스 패키지 S
- [패키지] 25-26 NDCK 클래식 패키지
월간 국립극장
- 소식 · 참여
- 월간 국립극장
2025년 4월호 Vol. 417
목차 열기코스② 동국대학교에서 남산까지
(남산공원 8번 입구 → 필동전망대 → 남산소나무힐링숲 → 동대입구역)
지금 남산,
사부작사부작 걷기 좋은 세 가지 코스
동대입구역 6번 출구를 나서면 공기가 사뭇 달라진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을 뿐인데, 도심의 바쁜 기운과 남산의 여유로운 공기가 오묘하게 섞여 있다.

동국대학교 봄날의 캠퍼스 풍경(사진출처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산책이 일상이 되는 곳
동국대학교 캠퍼스를 가로질러 오르면 남산공원 8번 입구가 나타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권 같은 곳이다. 마치 비밀 통로를 통해 호그와트로 가는 느낌이랄까. 번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몇 걸음만 옮기면 남산으로 바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남산공원 8번 입구. 서울에서 이런 마법 같은 전환이 가능한 곳이 얼마나 될까?
남산과 맞닿은 캠퍼스, 동국대학교. 주말의 교정은 평일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강의실은 깜깜했고, 불이 켜진 몇몇 건물에만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널찍한 운동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적당한 소음이 교정을 울리고 있었다. 캠퍼스를 둘러싼 담벼락 너머로는 남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느슨한 주말의 공기가 교정을 가득 둘러싸고 있었다.
학교 중앙에 자리한 정각원正覺院에서 걸음을 멈췄다. 원래 경희궁의 정전正殿이었던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귀빈을 접대하던 장소로 쓰였다고 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현대적 건물 사이에 떡하니 있는 모습이 매우 낯설었다. 시간이 층층이 쌓인 공간 같았다. 기와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바람이 한옥 마루를 스친다. 바람이 차가운 듯 따뜻하다. 정각원 앞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왼쪽에 끼고 다시 걸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타종을 하는 종각이 보였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활기 넘치는 캠퍼스의 기운을 받아 남산공원 8번 입구로 들어섰다. 완만한 흙길과 나무 계단이 이어졌다. 이 구간에는 잘 닦인 벤치가 여럿 있었다. 살랑 부는 봄바람이 너무 좋아서 털썩 앉았다. 배낭에 챙겨 온 간식을 주섬주섬 꺼냈다. ‘아, 맞다! 커피를 두고 왔다.’ 순간적으로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다.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남산 북측순환로와 맞닿는다. 산책하거나 달리는 사람들, 또 남산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왁자지껄 모여 있다. 여느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남산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 사부작사부작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이다. 점심을 먹고 나와 흙길을 걸으며 한껏 늘어지는 기분도, 강의가 끝난 후 남산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여유도 좋다.
잊고 온 커피 한 모금이 절실했다. 저 앞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페보다는 남산의 공기와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커피는 나중에 마셔도 되지만,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릴 테니까.

남산 위의 저 소나무, 그리고 아주 작은 소나무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맞춰 입은 중년 여성들이 필동 전망대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다. 남산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 할 때 그 소나무가 저 소나무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를 뻔했다.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지만 입을 닫고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남산에는 소나무가 정말 많았다.
북측순환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덱Deck 길로 들어섰다. 길 초입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 시끌벅적했던 대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편에 키가 두 뼘 남짓한 작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실험 삼아 심어 놓은 것처럼 어색한 배치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묘목을 바라보았다. 4년 넘게 자란 나무라는데도 아직 손바닥만 했다. 이 작은 소나무가 언젠가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 어쩐지 이 작은 소나무들을 위해 한마디 격려라도 해주고 싶어졌다.
‘언젠가는 튼튼한 철갑鐵甲을 두른 것처럼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 거야!’
길은 다시 북측순환로로 이어졌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근원지는 석호정, 국궁장이었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활을 당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니, 첫 화살을 쏘기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린다고 한다. 얇따란 활 한 촉을 쏘는 데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문득 조금 전에 봤던 작은 소나무들이 떠올랐다.
석호정을 지나 다시 길을 따라 내려오면 소나무 힐링숲이 나타난다. 입구에는 방문 시간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이 있다. 남산도 모든 사람을 언제나 받아 주는 건 아닌 모양이다. 길은 고운 흙길로 이루어져 있고, 숲을 사이에 두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아주 짧은 코스다.
이곳엔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맨발로 걷는 사람이 유독 많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퍽 낯설었지만, 이내 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직 맨발로 걸을 용기는 없었다. 대신 발바닥에 꾹꾹 힘을 주어 걸었다. 작은 숲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허~이! 읏차! 소리로 가득한 장충단공원의 주말
국립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을 빙 둘러 무지개길로 내려선다. 무지개길은 동대입구역과 국립극장을 잇는 지름길이다. 어디선가 “허~이!” “읏차!”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른 주말 아침인데도 테니스 코트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가만히 서서 기합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어깨를 들어 올려 라켓을 쥐고 싶었다.
유관순 동상을 지나 남산2호터널 입구 교차로 앞 신호등에서 걸음을 멈췄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는 장충리틀야구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4~5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펼치고 있었다. 투수는 공을 던지기 전에 발끝을 비비며 망설였고, 타자는 방망이를 단단히 고쳐 쥐었다. 작은 몸짓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과 집중력은 어른 못지않다.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느껴졌다.

지금은 흐르지 않는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이 멀리 자취를 드러냈다. 남산의 북쪽에서 발원해 청계천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지금은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시내는 흐르지 않는다.
남산팔영南山八詠 중 여덟 번째 항목인 ‘연계탁영沿溪濯纓, 계곡에 갓끈을 씻는 선비들의 운치’ 안내판만이 우두커니 서 있다. 남산팔영은 남산의 빼어난 여덟 가지 경치와 조망에 대해 읊은 시를 가리킨다.
테니스 코트와 야구장의 함성은 점차 멀어지고 공원은 한없이 고요했다. 수표교 바닥에는 마른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서성거렸다. 어쩌면 남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은 흐르지 않는 물과 흐르는 시간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이 길도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변해 가는 길 위에서 오늘 하루 사부작사부작 걸어 보자.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글·사진. 김광명 월간 『산』 칼럼니스트
그림. 윤예지 일러스트레이터